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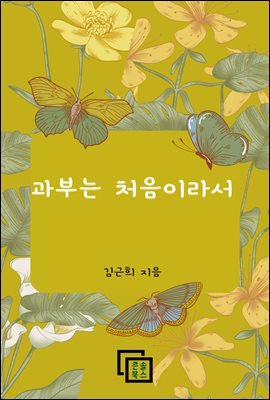
과부는 처음이라서
- 저자
- 김근희 저
- 출판사
- 큰솔북스
- 출판일
- 2023-11-20
- 등록일
- 2024-03-1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8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찰진, 그러면서도 우리삶을 속속들이 비추는 시들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런 시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다.
나의 부족한 감성탓이기도 했고 인문학적 소양이 일천한 탓이기도 했다.
나에게도 재주가 있다면 시를 쓰고 싶었다.
젊은 날에도 추상적인 시들을 쓰기는 했다.
여기저기 공모전에 보내기는 했지만 한번도 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오십이 넘어서 시를 쓰는 도반들을 만났고 폭포수처럼 내 삶을 시로 위로하게 되었다. 나의 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뭐 저렇게 자기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라고도 했다. 또 인생을 뭘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냐는 핀잔도 들었다. 아름답지 않은 시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치유하는것만으로도 좋았고 벅찼고 건강해졌다.
큰 시인의 길로 나가기엔 모자람이 많겠지만 내 시는 나에게 안성맞춤의 치유를 주고도 남았다. 어느 날 전시 된 내 시 앞에서 내 또래의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다. 내 이야기가 나만의 진실일뿐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목격했다.
그래서 나는 보통의 사람들이 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길 바란다. 나의 부족한 시집을 통해 자기 삶을 스스로 위로하는 시를 써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저만한 시집은 나도 내겠다는 포부를 갖길 바란다. 이만하면 내가 시집을 내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