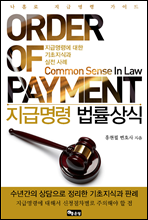상세정보

춘자, 나비가 되다
- 저자
- 이씨 저
- 출판사
- 좋은땅
- 출판일
- 2020-02-28
- 등록일
- 2020-05-2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3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야기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깊은 묵상 속에서 꿈꾸듯 만나는 형상이 아닌, 하느님 실체를 이 세상에서 직접 대면하는 일은 가능할까?
김 씨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다. 그는 가르침을 믿고 온전하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하느님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춘자를 만났다.
춘자는 가난하고, 배움도 짧고, 볼품없는 과부지만 나누고, 베풀고, 보듬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김 씨는 가혹하다. 김 씨는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김 씨는 왜 하느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일까? 김 씨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저 눈물을 흘리며 욥기의 마지막 구절을 읊조리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 가슴에 찍힌 화인火印이 지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욥기 4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