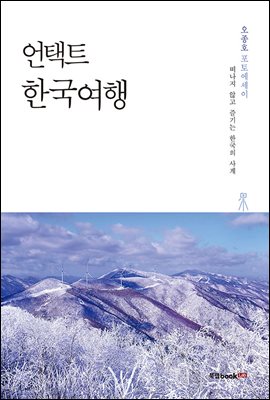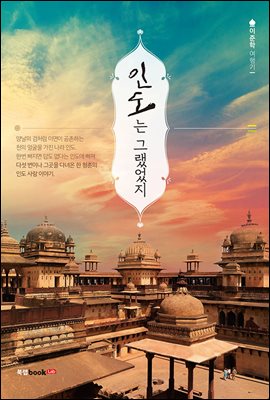상세정보

6657, 응급의학과입니다
- 저자
- 최영환 저
- 출판사
- 북랩
- 출판일
- 2020-11-06
- 등록일
- 2/21-/3-/5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9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b>“아무도 믿지 마. 오직 자기가 직접 보고 묻고 만져 본 것만 믿어.</br>그래야 환자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긴다.”</br></br>치열해서 더욱 위태로웠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들의 청춘</br>의사인 동시에 한국문학 연구자가 써서 더욱 사실적인 한국판 [ER]</b></br></br>2016년, 상훈은 존경하던 민 교수의 추모집 진행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 첫날인 1998년 3월 2일의 기억을 떠올린다. 응급의학과 4년 차 강경준과 3년 차 허진우를 비롯해 할리데이비슨을 모는 마취과 1년 차 이명호, 절친인 외과 1년 차 임정수까지. 그들과 병원에서 촌각을 다투며 벌인 모든 일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모든 게 서툴기만 하던 때, 응급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복기하는 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상한 사건들이 과거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