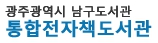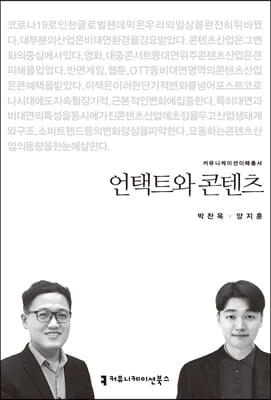상세정보

게임 디스티그마
- 저자
- 김혜영,유승호 저
- 출판사
- 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일
- 2021-02-28
- 등록일
- 2021-06-0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3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게임이 협력적 사고를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과 정서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중독, 폭력, 탈선, 학업부진과 같은 부정적 영향에만 집중해 ‘낙인(stigma)’을 찍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적 인간을 만든다. 게임 중독 문제의 경우, 중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게임을 하는 개인과 그 상황으로 관점이 이양될 필요가 있다. 게임을 해서 좋다/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보다 총체적이고 상황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를 스티그마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디스티그마(destigma, 탈낙인)를 위한 담론으로서 개인의 인정욕구와 공동체 유대를 중심으로 심리학 및 사회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낙인(stigma)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에 속성 그 자체보다는 관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스티그마의 문제는 사회적 삶에서의 정체성이 손상된 것이며, 이는 낙인을 보유한 개인의 특성보다는 타인의 관점과 시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스티그마(social stigm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