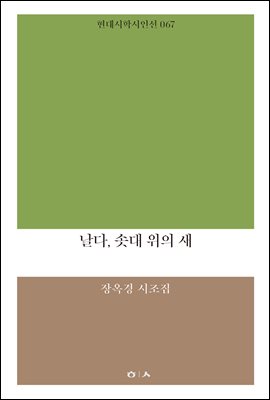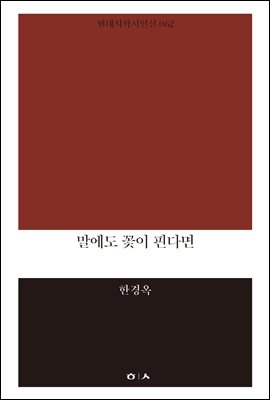상세정보

문득 나한테 묻고 있네
- 저자
- 김영길 저
- 출판사
- 현대시학사
- 출판일
- 2021-03-05
- 등록일
- 2021-06-09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1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김영길 시인의 시는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섬세한 공감에서 출발한다. 더러는 비릿하고 더러는 아릿한 냄새가 나는 것도 거기에서 연유한다. 가족과 친척은 물론이고 여행지에서 만난 모든 것이 공감의 대상이 된다. “매미들의 신호”를 읽고, “아기 선인장이 목말 타”는 소리를 듣고, “돌이 신이 되”는 기도도 듣는다. 시인이 듣는 그 소리를, 우리는 우산을 접고 “산도 들판도 접”으며 함께 귀 기울이게 된다. 시인은 또한 대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이 하는 내면의 말을 곡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 적으면서 독자에게 견고한 믿음을 선사한다. 마침내 이 시집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동백꽃이 떨어질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시인의 시적 대상 속에 들어가 있는 듯이 감성의 캡슐이 툭툭 터지고 동백꽃처럼 활짝 웃게 된다.
― 한혜영 시인